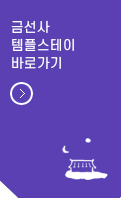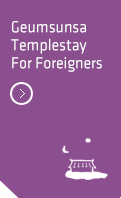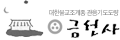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사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훈설래 작성일25-09-27 11:43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66.bog2.top
4회 연결
http://66.bog2.top
4회 연결
-
 http://48.bog2.top
4회 연결
http://48.bog2.top
4회 연결
본문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전환 시점과 속도를 두고는 한미가 서로 다른 계산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신중론을 견지하며 '동상이몽'이라는 평가가 25일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3~2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5년적금
회의와 관련해 "양측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라고 밝혔다.
'상당한 진전'이라는 표현은 지난 5월 열린 제26차 KIDD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양측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원론적 합의만 확인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재무상담
가 전작권 반환에 회의적이라는 관측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미 간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외교안보 분야 과제로 못 박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상당한 진척을 봤다. 올해 내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무료바다이야기
C)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이 보여준 입장은 한국보다 신중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두를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며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백광소재 주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워싱턴 조야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군사적 과제라기보다 정치적 사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KIDD 공동보도문에서도 '상당한 진전'이란 표현은 빠졌다.
바다이야기배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B-2 스텔스기 모형을 바라보고 있다. 2025.8.31/뉴스1 (백악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전작권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연합사령관이 권한을 갖고 있으나, 전환 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1단계 검증은 지난 2019년 8월 통과했고, 2단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전력 증강 등을 통해 조건부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KIDD 이후 나온 '상당한 진전'이란 표현은 2단계 충족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3단계 평가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또한 한미가 합의한 3대 조건인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객관적 지표만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안보 환경은 정세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정치적 합의가 불가피하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자주국방 강화와 동맹 현대화를 병행하며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아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임무를 줄이고 대만 위기 시 관여 등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선 한국군에 한반도 방어 주도권을 조기에 넘겨주는 방안이 미국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오는 11월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다시 논의해 현재의 '동상이몽' 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FOC 검증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구체화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도 더욱 진전된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go@news1.kr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전환 시점과 속도를 두고는 한미가 서로 다른 계산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신중론을 견지하며 '동상이몽'이라는 평가가 25일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3~2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5년적금
회의와 관련해 "양측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라고 밝혔다.
'상당한 진전'이라는 표현은 지난 5월 열린 제26차 KIDD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양측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원론적 합의만 확인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재무상담
가 전작권 반환에 회의적이라는 관측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미 간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외교안보 분야 과제로 못 박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상당한 진척을 봤다. 올해 내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무료바다이야기
C)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이 보여준 입장은 한국보다 신중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두를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며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백광소재 주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워싱턴 조야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군사적 과제라기보다 정치적 사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KIDD 공동보도문에서도 '상당한 진전'이란 표현은 빠졌다.
바다이야기배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B-2 스텔스기 모형을 바라보고 있다. 2025.8.31/뉴스1 (백악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전작권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연합사령관이 권한을 갖고 있으나, 전환 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1단계 검증은 지난 2019년 8월 통과했고, 2단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전력 증강 등을 통해 조건부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KIDD 이후 나온 '상당한 진전'이란 표현은 2단계 충족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3단계 평가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또한 한미가 합의한 3대 조건인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객관적 지표만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안보 환경은 정세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정치적 합의가 불가피하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자주국방 강화와 동맹 현대화를 병행하며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아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임무를 줄이고 대만 위기 시 관여 등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선 한국군에 한반도 방어 주도권을 조기에 넘겨주는 방안이 미국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오는 11월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다시 논의해 현재의 '동상이몽' 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FOC 검증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구체화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도 더욱 진전된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go@news1.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