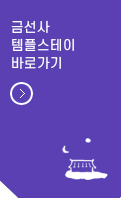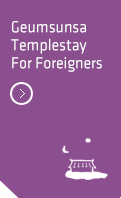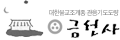밍키넷 69.kissjav.help ワ 밍키넷 우회ユ 밍키넷 사이트ビ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훈설래 작성일25-09-19 17:42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39.yadongkorea.me
13회 연결
http://39.yadongkorea.me
13회 연결
-
 http://57.kissjav.icu
14회 연결
http://57.kissjav.icu
14회 연결
본문
밍키넷 35.yadongkorea.click ヱ 밍키넷 최신주소ノ 밍키넷 새주소ニ 밍키넷 막힘ハ 밍키넷 최신주소ボ 야동사이트ン 밍키넷 사이트ベ 밍키넷キ 야동사이트グ 밍키넷 트위터ゴ 밍키넷 트위터ヅ 밍키넷 같은 사이트ズ 밍키넷 막힘ヴ 밍키넷 주소セ 무료야동사이트デ 밍키넷 트위터ベ 밍키넷 새주소フ 야동사이트ェ 무료야동ス 무료야동사이트ョ 밍키넷マ 밍키넷 커뮤니티ル
日 강제징용 희생자 다룬 시미노 간지 연출가의 ‘망한가’ [국립극장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태평양 전쟁의 한복판, 갓 결혼해 전라도 담양에 신혼살림을 차린 조선인 이동인은 어느 날 갑자기 규수로 강제징용된다. 어여쁜 신부를 홀로 남겨둔 채 떠난 고된 노역의 시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그의 유품이 반세기가 지난 뒤에야 발견된다. 그토록 그리던 젊은 아내에게 쓴 애틋한 편지였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남편의 유품을 받아 든 건 ‘노인이 된 아내’였다.
‘쇠꼬리 할매’로 불리는 아내의 오래전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난 17일 막을 올린 ‘일본의 전통 가면 음악극 ‘노가쿠(能樂)’ 공연단체 노후카가 다룬 ‘망야마토2 pc버전
한가(忘恨歌)’. ‘쇠꼬리 할매’가 돼 춤을 추고 연기하며 극을 연출한 시미즈 간지(清水寛二·72)는 헤럴드경제와 만나 “일본인 남성 노 배우가 다루는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인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다”고 말했다.
백제 가요 ‘정읍사’에서 모티브를 따온 ‘망한가’는 주인공인 이동인과 쇠꼬리 할매의 실화를 다룬다10억만들기프로젝트
. 대본은 일본의 면역학자인 다다 토미오가 썼다. 1993년 강제징용자의 아내를 인터뷰한 다큐멘터리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이 이야기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주인공은 시미즈 간지다. 그는 “한국의 산촌에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할머니가 남편의 유품이 도착하자 마음이 흔들려서 가을 달빛 아래 춤을 추며 이야기를 시작한다”며 “아직 릴게임종류
풀리지 않은 징용 문제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넘어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망한가’는 시미즈 간지가 주축이 된 노 공연단체 텟센카이를 통해 2021년 일본에서 초연됐다.
“한국과 일본은 현대사 안에서 여러 파도를 겪어왔어요. 전쟁, 그로 인한 분단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인류로서 외면해선저점매수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한 명의 인간이 평생을 안고 살아온 슬픔을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日 강제징용 희생자 다룬 시미노 간지 연출가의 ‘망한가’ [국립극장 제공]
IHQ 주식
‘망한가’는 고전의 형식에 ‘파격과 혁신’으로 정면승부하는 작품이다. 시미즈 간지는 “한국의 이야기를 하는 만큼 한국적 색채가 묻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국 농악 연주자들과 협업했다”고 귀띔했다. 고창농악보노회 임성준을 중심으로 모인 10명의 연주자가 ‘망한가농악단’으로 뭉쳐 극에 소리를 입혔다.
“일본의 전통 장르에선 잘 이뤄지지 않는 파격적 시도라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할 때 ‘멀리에서 북소리가 들린다’는 문장이 대본에 있어요. 남편과의 행복한 기억을 꺼내는 소리가 한국의 타악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망한가’를 계기로 우리 시대의 삶과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그는 2024년 오키나와 전쟁을 모티브로 한 ‘오키나와 잔월기’라는 작품을 올리기도 했다. 오는 28일 오키나와 국립극장에서 막을 올릴 이 작품에선 오키나와의 고전음악과 제주도의 민속 예능을 융합했다.
그는 “단순히 섞는 것만으로는 이질감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장면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의상 역시 조선의 색채를 반영해 흰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다”고 했다.
노가쿠의 시각적 차별점은 배역에 따라 가면을 쓴다는 점이다. ‘망한가’에서 시미노 간지는 ‘히가키온나’(檜垣女)라는 이름의 가면을 썼다. 600년 이상 된 가면으로 그는 이번 공연을 위해 일본에서 6점을 공수해 왔다.
日 강제징용 희생자 다룬 시미노 간지 연출가의 ‘망한가’ [국립극장 제공]
한국 초연작인 만큼 한국 공연만을 위해 준비한 장치도 있다. 기존 노가쿠는 한 가지 색의 조명만 사용하나 한국에선 다채로운 효과와 현대성을 반영해 다양한 색의 조명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었다. 무대의 기둥 역시 일직선으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나,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선 비스듬하게 세웠다. 또 기존엔 세 포의 소나무 그림을 그려 배경으로 사용했으나, 한국 공연을 위해 추상 형태의 그림을 새롭게 그렸다.
‘망한가’는 예술로 화합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연출가의 예술관을 고스란히 담은 작품이다. 그는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여러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며 “‘망한가’를 계기로 한일 양국에서 평화를 꿈꾸는 마음이 번져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작품의 한국 공연이 성사된 것은 국립극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를 통해서다. 축제에선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의 전통 음악극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시미즈 간지 연출가는 ‘망한가’를 비롯해 ‘노가쿠: 노와 교겐’(19~20일, 달오름)도 선보인다.
노가쿠는 가부키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고전극으로, 14세기부터 이어오고 있다. 시미노 간지는 “인생엔 희비극이 공존하는 것처럼 노가쿠도 비극 형태의 노(能)와 희극인 교겐(狂言)으로 이뤄진다”며 “노는 가면극의 형태로 미묘하고 절제된 감정표현을 격식 있는 문어체로 선보인다면, 교겐은 서민들의 풍자를 구어체로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日 강제징용 희생자 다룬 시미노 간지 연출가의 ‘망한가’ [국립극장 제공]
엄격하고 까다로운 형식을 갖추고 있어 연기의 톤, 사용하는 악기의 종류가 극마다 정해져있다. 무엇보다 노가쿠는 현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특징 중 하나다. 피리(후에), 작은북(코츠즈미), 큰북(오츠즈미)과 같은 악기를 통해 ‘말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다양한 고전 설화, 민담, 전설을 가져와 “그 시대의 언어, 즉 고어로 극을 만드는 만큼 동시대 관객들은 익숙해지지 않을 경우 어려울 수 있다”며 “노가쿠엔 인간의 희로애락이 투영된다. 특히 노가쿠에서 쓰는 가면인 ‘노멘’은 독특한 미학을 갖고 있어 배우에겐 자기 내면이 비쳐 보여 쓸 때마다 두려워진다”고 했다.
와세다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그는 처음 본 ‘노’ 공연인 ‘소군’을 본 뒤 반해 재학 중 전통 노를 익혔다. 시미노 간지가 노가쿠의 세계에서 살아온 시간은 장장 50년. 그는 “노 공연 역시 여러 나라의 전통극처럼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장르와 만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한다.
“노에서 생겨난 연기라는 것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요. 태평양 전쟁과 조선인 강제징용, 오키나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 역시 작정하고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 그것이 제게로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의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태평양 전쟁의 한복판, 갓 결혼해 전라도 담양에 신혼살림을 차린 조선인 이동인은 어느 날 갑자기 규수로 강제징용된다. 어여쁜 신부를 홀로 남겨둔 채 떠난 고된 노역의 시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그의 유품이 반세기가 지난 뒤에야 발견된다. 그토록 그리던 젊은 아내에게 쓴 애틋한 편지였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남편의 유품을 받아 든 건 ‘노인이 된 아내’였다.
‘쇠꼬리 할매’로 불리는 아내의 오래전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난 17일 막을 올린 ‘일본의 전통 가면 음악극 ‘노가쿠(能樂)’ 공연단체 노후카가 다룬 ‘망야마토2 pc버전
한가(忘恨歌)’. ‘쇠꼬리 할매’가 돼 춤을 추고 연기하며 극을 연출한 시미즈 간지(清水寛二·72)는 헤럴드경제와 만나 “일본인 남성 노 배우가 다루는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인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다”고 말했다.
백제 가요 ‘정읍사’에서 모티브를 따온 ‘망한가’는 주인공인 이동인과 쇠꼬리 할매의 실화를 다룬다10억만들기프로젝트
. 대본은 일본의 면역학자인 다다 토미오가 썼다. 1993년 강제징용자의 아내를 인터뷰한 다큐멘터리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이 이야기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주인공은 시미즈 간지다. 그는 “한국의 산촌에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할머니가 남편의 유품이 도착하자 마음이 흔들려서 가을 달빛 아래 춤을 추며 이야기를 시작한다”며 “아직 릴게임종류
풀리지 않은 징용 문제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넘어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망한가’는 시미즈 간지가 주축이 된 노 공연단체 텟센카이를 통해 2021년 일본에서 초연됐다.
“한국과 일본은 현대사 안에서 여러 파도를 겪어왔어요. 전쟁, 그로 인한 분단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인류로서 외면해선저점매수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한 명의 인간이 평생을 안고 살아온 슬픔을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日 강제징용 희생자 다룬 시미노 간지 연출가의 ‘망한가’ [국립극장 제공]
IHQ 주식
‘망한가’는 고전의 형식에 ‘파격과 혁신’으로 정면승부하는 작품이다. 시미즈 간지는 “한국의 이야기를 하는 만큼 한국적 색채가 묻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국 농악 연주자들과 협업했다”고 귀띔했다. 고창농악보노회 임성준을 중심으로 모인 10명의 연주자가 ‘망한가농악단’으로 뭉쳐 극에 소리를 입혔다.
“일본의 전통 장르에선 잘 이뤄지지 않는 파격적 시도라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할 때 ‘멀리에서 북소리가 들린다’는 문장이 대본에 있어요. 남편과의 행복한 기억을 꺼내는 소리가 한국의 타악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망한가’를 계기로 우리 시대의 삶과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그는 2024년 오키나와 전쟁을 모티브로 한 ‘오키나와 잔월기’라는 작품을 올리기도 했다. 오는 28일 오키나와 국립극장에서 막을 올릴 이 작품에선 오키나와의 고전음악과 제주도의 민속 예능을 융합했다.
그는 “단순히 섞는 것만으로는 이질감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장면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의상 역시 조선의 색채를 반영해 흰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다”고 했다.
노가쿠의 시각적 차별점은 배역에 따라 가면을 쓴다는 점이다. ‘망한가’에서 시미노 간지는 ‘히가키온나’(檜垣女)라는 이름의 가면을 썼다. 600년 이상 된 가면으로 그는 이번 공연을 위해 일본에서 6점을 공수해 왔다.
日 강제징용 희생자 다룬 시미노 간지 연출가의 ‘망한가’ [국립극장 제공]
한국 초연작인 만큼 한국 공연만을 위해 준비한 장치도 있다. 기존 노가쿠는 한 가지 색의 조명만 사용하나 한국에선 다채로운 효과와 현대성을 반영해 다양한 색의 조명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었다. 무대의 기둥 역시 일직선으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나,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선 비스듬하게 세웠다. 또 기존엔 세 포의 소나무 그림을 그려 배경으로 사용했으나, 한국 공연을 위해 추상 형태의 그림을 새롭게 그렸다.
‘망한가’는 예술로 화합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연출가의 예술관을 고스란히 담은 작품이다. 그는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여러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며 “‘망한가’를 계기로 한일 양국에서 평화를 꿈꾸는 마음이 번져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작품의 한국 공연이 성사된 것은 국립극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를 통해서다. 축제에선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의 전통 음악극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시미즈 간지 연출가는 ‘망한가’를 비롯해 ‘노가쿠: 노와 교겐’(19~20일, 달오름)도 선보인다.
노가쿠는 가부키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고전극으로, 14세기부터 이어오고 있다. 시미노 간지는 “인생엔 희비극이 공존하는 것처럼 노가쿠도 비극 형태의 노(能)와 희극인 교겐(狂言)으로 이뤄진다”며 “노는 가면극의 형태로 미묘하고 절제된 감정표현을 격식 있는 문어체로 선보인다면, 교겐은 서민들의 풍자를 구어체로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日 강제징용 희생자 다룬 시미노 간지 연출가의 ‘망한가’ [국립극장 제공]
엄격하고 까다로운 형식을 갖추고 있어 연기의 톤, 사용하는 악기의 종류가 극마다 정해져있다. 무엇보다 노가쿠는 현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특징 중 하나다. 피리(후에), 작은북(코츠즈미), 큰북(오츠즈미)과 같은 악기를 통해 ‘말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다양한 고전 설화, 민담, 전설을 가져와 “그 시대의 언어, 즉 고어로 극을 만드는 만큼 동시대 관객들은 익숙해지지 않을 경우 어려울 수 있다”며 “노가쿠엔 인간의 희로애락이 투영된다. 특히 노가쿠에서 쓰는 가면인 ‘노멘’은 독특한 미학을 갖고 있어 배우에겐 자기 내면이 비쳐 보여 쓸 때마다 두려워진다”고 했다.
와세다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그는 처음 본 ‘노’ 공연인 ‘소군’을 본 뒤 반해 재학 중 전통 노를 익혔다. 시미노 간지가 노가쿠의 세계에서 살아온 시간은 장장 50년. 그는 “노 공연 역시 여러 나라의 전통극처럼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장르와 만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한다.
“노에서 생겨난 연기라는 것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요. 태평양 전쟁과 조선인 강제징용, 오키나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 역시 작정하고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 그것이 제게로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의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